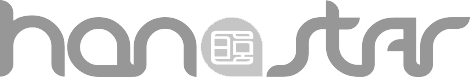일단 과하다. 스크린은 모든 액션 영화 장르의 장면들을 조합해놓은 듯한 끌리셰(“판을 뜨다, 흉내내다” 라는 뜻을 가진 프랑스어로 영화에서 상투적인 장면들을 의미한다)들로 가득하다. 새로운 액션장면을 찾기가 힘들 정도다. 물론 액션영화 특유의 빠른 속도감, 박진감이라는 공식에는 충실했다. 지루하지 않은 스피디한 극 전개는 몰입의 이유가 됐지만, 극장을 나서며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려고 했던 걸까?” 라는 질문에는 아직까지 답을 내리지 못하겠다. 개연성의 부족, 그게 바로 이 영화의 맹점이다.

의문의 살인사건에 휘말린 백여훈(류승룡 분)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경찰에 쫓기는 신세가 된다. 그의 담당 의사였다는 이유만으로 태준(이진욱 분)은 임신한 아내 희주(조여정 분)를 납치당하게 되고 백여훈을 찾아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다. 경찰과 태준의 표적은 백여훈이다.
틱장애를 갖고 있는 동생 성훈(진구 분)을 대신해 여훈이 사무실을 찾은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피비린내 나는 그 곳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여훈은 살인범이 돼버린 것이다. 형을 만나야만 하는 동생, 동생을 찾아온 형 ― 그러나 이들의 만남은 동생 성훈이 송반장(유준상 분)에게 잔인하게 살해되고 나서야 비로소 이루어진다. 성훈에게 납치되었던 희주는 태준의 품으로 돌아오는 듯 했으나 더 잔인한 무리들에게 넘겨진다. 바로 송반장 일당이 그들이다.
송반장은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동료인 영주(김성령 분)를 없애는 데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그저 불필요하다면 제거하면 된다. 성훈 역시 서류상 고아였다는 것이 그의 이용목적이었다. 동생 성훈의 죽음을 계기로 여훈은 송반장의 실체를 알게 된다.
바로 의문의 살인사건의 진범은 송반장이었던 것이다. 이제 여훈의 표적은 송반장이다.
송반장은 공권력이라는 가면을 쓰고 어떤 흉악한 범죄자보다 더한 악행을 자행해왔다. 돈의 노예가 되어 일말의 죄책감조차 갖지 않는 그의 모습은 인간이 어디까지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마치 <레옹>의 게리올드만이 연기한 스탠스필드를 보는 것 같다.
위험에 처한 희주는 결국 태준의 품에 안기고, 여훈은 죽을힘을 다해 송반장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겨눈다.

영화는 우리가 원하는 “권선징악(勸善懲惡)”이라는 명제를 기꺼이 이행해준다. 여훈의 표적이었던 송반장의 악행은 그로인해 종지부를 찍게 된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악당을 이겨낸 여훈은 히어로가 되기에 충분하다.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된 이후에 나타나는 공권력의 무리들은 변하지 않는 액션 영화의 끌리셰다. 마치 뒷정리를 하기 위한 것 같은......
4년이란 시간이 흘러 교도소를 출소하는 여훈, 그를 맞이하러 나온 태준과 희주의 곁에는 어느새 예쁜 딸아이가 함께 하고 있다.
해피엔딩은 개운한 마음으로 극장을 나서게 해주지만 틀에 박힌 듯한 엔딩장면은 어딘지 모르게 익숙해서 영화의 마무리를 아주 편한 방법으로 봉합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게 만든다. 형제애를 보여주는 밋밋한 에피소드는 죽은 동생을 위해 사지에 뛰어든 여훈의 모습에서 감동을 배가시켜주기가 힘들다. 액션에 치중한 나머지 감동을 줄 수 있었던 스토리의 생략이 아쉽다. 또한 영주라는 배역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쉽게 사라지지 않았나 싶다. 송반장의 악행을 위한 희생물로 맥없이 제거돼 버린 배역이 되고 말았다.
물론 36시간동안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에 모자람이 없다. 영화는 군더더기 없이 진행된다. 하지만 무엇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지는 여전히 애매하다.
형제애? 부패한 공권력의 이면?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고 했던가! 액션신의 과잉이 스토리에 힘을 더해주지 못했다.
그러나 40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액션 장면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을 배우 류승룡, 김성령, 유준상의 변신에는 박수를 보낸다.

[ⓒ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