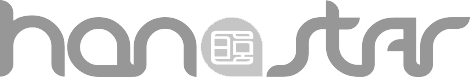[이만수의 포수론] (8) 포수와 장비 관리
 |
| 포수는 얼굴을 보호하는 마스크 뿐만아니라 가슴보호대, 무릎보호대, 손가락보호대 등을 착용한다. 특히 공을 받는 미트와 손가락 보호대는 손과 한몸처럼 딱 맞는 것을 착용해야 한다. 사진은 연예인 야구단 스마일의 일반인 포수 오경석 씨. (한스타DB) |
요즘 국산 야구장비가 굉장히 잘 나오지만 예전에는 국산 장비의 품질이 크게 좋지 않았다. 배트나 글러브, 스파이크 등은 주로 일본 제품을 사용했다. 좋은 품질의 장비를 쓰기 위해선 사비를 들여서라도 어렵게 외국에서 구입했다. 선수시절 포수 미트를 매일 손질하는 것이 내 하루 일과 중 중요한 부분이었다. 가죽 품질이 좋지 않아서 뻣뻣하면 길들이기까지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 포수 미트를 물에 담구었다가 바람이 통하는 그늘에 말려서 바셀린을 발라가며 몇 달이고 내 손에 맞도록 손질했다.
그러면 한국보다 역사도 훨씬 오래됐고 연봉도 훨씬 많이 받는 메이저리거들은 장비를 어떻게 대할까? 지금도 기억에 남는 선수가 한 명 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내야수 토니 그래파니노다. 이 선수는 자신의 글러브를 경기 종료 후 손질하지 못하면 다음날 글러브 손질을 위해 일부러 좀 더 일찍 나와 운동장 한 켠에서 열심히 기름칠을 하고 깨끗하게 닦으며 자신의 장비를 애지중지했다.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연봉을 받아도 야구장비 손질을 참 열심히 한다. 스파이크 같은 경우는 라커룸에 속해 있는 전문가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글러브와 배트는 본인들이 굉장히 아껴가며 손질한다. 어떤 선수는 배트의 탄성에 좋다며 소뼈를 가지고 와서 배트를 닦기도 했다.
최근 한국 프로야구의 스타급 선수들에게는 야구 장비를 만드는 회사에서 용품 지원을 해주는 경우가 많다. 초창기 프로야구 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장비의 품질도 좋아졌고 풍족하게 공급도 해준다. 그래서인지 선수들이 글러브나 스파이크를 아끼고 잘 관리하는 것을 보기 어렵다. 선수들을 눈 여겨보니 매끈하게 길들여진 글러브를 가진 선수가 많지 않았다. 운동선수에게 몸이 재산이다. 팬에게 멋진 플레이를 보여 주는 게 우선이라면 서포터 착용이나 장비관리부터 철저히 해야한다.
포수에게 미트는 가장 중요한 장비다. 예전에는 포수 엄지 보호대라는 게 없었다. 그러나 요즈음 포수에게도 야수들처럼 손가락 보호대가 있다. 자기 엄지에 맞게 보호대를 만들어서 훈련할 때부터 자연스럽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연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꽉 쪼여진 미트를 엄지 보호대에 맞게 줄을 풀어 맞추어 제 2의 손처럼 익숙해질 때 까지 계속 두드려줘야 한다. 장비를 자기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아끼는 선수일수록 경기력이 좋을 확률이 높다.
비싼 브랜드의 장비나 화려한 외모보다 친구처럼 가까이 두고 내내 아껴주는 장비로 멋진 경기력를 보여주는 선수가 훨씬 팬에게 오래 기억되고 멋지지 않을까.
[이만수 전 SK 감독, 헐크재단 이사장]
[ⓒ 한스타미디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